■ 사라진 일본: 아름다운 것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 알렉스 커 지음 | 윤영수·박경환 옮김 | 글항아리 | 400쪽

긴 세월 일본은 외국인들에게 이국정취를 자아내는 나라였다. 특히 서양인들을 향한 일본인의 환대는 그들이 일본 땅에 부드럽게 안착하는 데 디딤돌이 되었다. 일본에 푹 젖어든 서양인들은 일본에 관한 책을 쓰기 시작했다. 크게 두 갈래로 나뉘었는데, 하나는 일본에 대한 경외를 드러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 때리기였다. 알렉스 커의 이 책은 경외심과 비판, 빛과 어둠 모두를 담고 있다.
요즘 우리는 일본을 묘사할 때 ‘잃어버린 30년’이란 수식어를 쓴다. 이 말은 경제 선진국의 지위를 잃었다는 뜻이지만, 저자가 보기에 일본이 진정 잃은 것은 풍광과 아름다움이다. 그는 일본의 과거 잔영을 좇아 아름다움을 발견하는데, 어느 찰나에 그것은 눈 밖으로 사라진다. 그의 시선은 사물과 풍경을 낚아채려 하지만, 현대화를 추구하는 일본인들은 움직이는 손발을 갖고 있다. 운동에너지가 없는 눈은 손발을 당해낼 수 없으며, 과거와 현재의 경쟁에서 승자는 언제나 현재다. 따라서 이 책은 미의 상실, 쇠퇴에 대한 이야기다.
이 책이 독특한 것은 이방인이 타국을 여행하는 이야기가 아닌, 빈집에 들어가 그곳에 남겨진 몇십 년 몇백 년 전 일본인의 삶을 엿보는 데서 시작한다는 점이다. 1970년대에 일본 지방의 집들은 이미 버려지고 있었다. 시골에서의 삶이 전망 없어 불안했던 사람들은 싱크대에는 수저를, 화장실에는 칫솔을 남겨둔 채 급히 터전을 떠났다. 1973년 1월, 이야 계곡 동쪽에 있는 쓰루이 마을에 갔다. 거기서 18세기에 지어진 집 하나를 발견했는데, 바로 자신이 찾던 집임을 알아차렸다. 17년째 폐허였던 그 집을 사서 6월에 입주한 뒤 치이오리라는 이름을 지었다. 그의 나이 스물한 살 때의 일이다. 그곳에서 저자는 사회를 읽을 수 있었다.
그가 처음 이야 계곡에 발을 들여놓았던 때에도 이미 환경은 파괴되고 있었지만, 이상한 점은 시민들의 저항이나 공론화가 거의 전무했다는 것이다. 파괴에 가속도가 붙자 저자는 “이제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추한 나라”임을 깨달았다. 저자는 친구들이 일본을 방문하면 곤혹스러웠다. 친구들은 이렇게 물었다. “간판이나 전선, 콘크리트가 안 보이는 데는 없어?” 그의 눈에 이제 시골은 얼룩투성이다. 3만 개의 강과 하천 중 단 세 곳만 빼고 모두 댐이 설치됐으며, 해안선도 콘크리트가 덮고 있다. 일본이 산림 관리에 투자하는 수억 달러는 오로지 조림산업에만 쓰이며, 전깃줄을 매설하지 않아 거대한 철탑과 전봇대가 전국 각지의 도시 풍광을 지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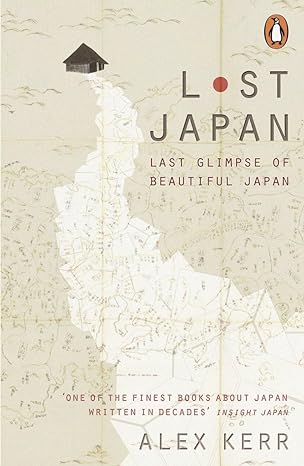
일본의 자연과 거리 풍경이 망가지자 저자는 추상의 세계로 눈을 돌렸다. 가부키는 일본 문화의 두 축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을 잡고 있다. 한쪽에는 에도시대의 자유분방한 성문화 즉 관능미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예술과 삶을 순수한 정수만 남을 때까지 다듬고 줄이는 형식미가 있다. 일본 예술은 이 두 경향이 경합을 벌여온 역사다. 무로마치 시대 말기에는 황금 병풍이 인기를 얻다가 다도의 대가들이 출현하자 투박한 흙색 다기가 미학적인 것으로 떠받들여진 것이 그 한 가지 예다. 오늘날에도 이 경쟁은 계속된다. 한쪽에는 정원이란 정원은 모두 갈퀴로 긁어놓는 ‘멸균 과정’이 있는가 하면, 다른 쪽에서는 파친코와 외설적인 심야 TV 방송이 버젓이 사람들의 이목을 잡아끌고 있는 식이다.
가부키에서 얻은 미적 감식안을 저자는 다도와 서예, 그리고 미술품 수집으로 확장시켜간다. 감식안은 일본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되어주지만, 그는 늘 경계인으로서의 자각을 잃지 않았다. 시골 폐가의 바닥을 쓸고 닦으며 한 줌의 빛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다가도, 도시의 세련된 문화 속으로 들어가 가장 정제된 형식미를 간취해내는 것처럼 이 책 전체는 늘 구석과 중심을 아우른다.
저자의 직업은 미술품 수집가다. 본문에는 그가 어떻게 예술 감식안과 물건을 고르는 눈을 갖게 됐는지 그 과정이 흥미롭게 펼쳐진다. 저자는 자신의 컬렉션 능력이 오로지 하나의 사실에 기대고 있다고 말한다. 일본인들의 아시아 미술에 대한 무관심! “그들의 무관심이 지속되는 한 나는 컬렉션을 계속 늘려갈 수 있다.” 그가 던진 농담 같은 이 한마디는 일본인을 향한 뼈아픈 지적이었다.
이 책 9장의 제목은 ‘교토는 교토를 싫어한다’이다. 저자는 과거 영광스러운 수도의 백성이었던 그들의 오만함에 감춰진 자기혐오를 읽어낸다. 그것은 이 책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다. 왜냐하면 그들이 극도의 예의와 형식을 내세워 감추는 속내를 저자가 훤히 드러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