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을 말하다_ 『최후의 대학』 (김재춘 지음, 학이시습, 306쪽, 2023.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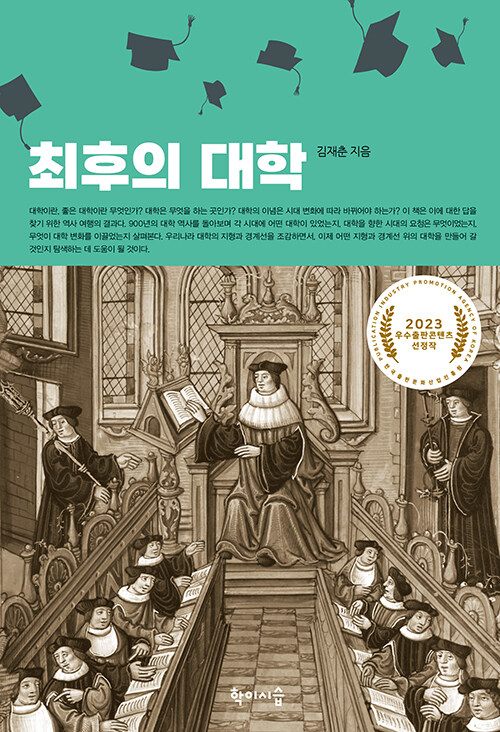
우리는 중세 대학이나 근대 대학에 대한 향수를 지닌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된다. 중세 대학은 새로운 학문을 가르치고 배우려는 사람들의 학문·교육 공동체로서 출범했다. 그리고 근대 대학의 원형으로 간주되는 독일의 베를린대학 또한 이상적인 연구·교육 공동체로 출범했다. 훔볼트의 주도로 설립된 베를린대학은 정부의 재정 지원과 신분 보장을 받으면서도 교수는 연구하고 가르칠 자유를, 학생은 배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공동체였다. 이런 ‘순수성’에 주목한 사람들은 서로 갈등되거나 모순되기 조차한 여러 목적과 기능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현대 대학, 특히 연구 중심 대학의 ‘비순수성’을 비판하는 경향이 있다. 자본과 경쟁으로 얼룩진 대학의 삶에 질리고 지친 학자나 교수들은 이런 순수한 학문·연구·교육 공동체로서 대학을 그리워하는 것은 십분 이해된다. 그러나 순수한 학문, 교육, 또는 연구공동체로서 대학이 과연 인간 사회에서 존속할 수 있을까?
캘리포니아대학체제를 만들었던 클라크 커(Clark Kerr) 총장은 『대학의 용도』에서 이런 순수한 공동체를 추구하는 교수들을 “하늘에 있는 파이에 대한 환상(vision of pie-in-the-sky)을 지닌” “학자공화국”에 속한 사람으로 묘사했다. 대학의 역사도 클라크 커 총장 편에 서 있다. 학문·교육의 자유를 누렸던 중세 대학은 교회의 공인과 지원을 받으면서 점차 학문·교육 공동체의 순수성을 상실했다. 자유로운 연구·교육 공동체로 출범했던 베를린대학도 훔볼트의 설립 이념대로 대학이 운영될 수 없었다. 대학의 이상과 현실 간의 괴리를 목격한 훔볼트는 베를린대학 설립 2년 만에 교육계에서 물러났으며, 베를린대학 설립 10년도 안된 시점에서 프로이센 국왕 등 독일 군주들은 코체부 살해 사건을 계기로 학생단체 해산, 대학감독관 파견, 출판물 검열 등의 규제 내용이 담긴 ‘카를스바트 결의’를 통과시켰다. 이 결의문에는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국가의 기강을 흔들 것으로 판단되는 독일 대학 내의 모든 강사와 교수들을 즉각 해고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책 212-215).
최근 우리 사회에서 종종 제기되는 국립대학 무상교육화 논의는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최근 우리 사회의 주목을 받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담론도 지역거점국립대학의 무상교육화를 전제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대학 동향은 어떠한가? 대학 무상교육의 상징이었던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대학교육의 유상화를 시도하고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이다. 대표적인 주립대학인 캘리포니아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은 해가 갈수록 주 거주민에게도 비싼 등록금을 부과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대학체제를 구축했던 1960년대에는 무상교육에 가까웠던 UC 대학들은 설립 30년이 지난 1990년대에는 3천 달러(당시 한화로 약 200만원)의 등록금을 부과했다가 다시 30년이 지난 2022/2023년 현재 1만 3천 달러(한화로 약 1천 600여만 원)의 등록금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혁신 대학인 애리조나주립대학(ASU)은 2000년대 초반에는 대학 재정의 약 90%가 주 정부의 지원금이었으나 2022/2023학년도에는 주 정부에서 받은 지원금은 대학 재정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애리조나주립대학은 과감한 대학 혁신을 통해 등록금 수입과 연구비 수주를 대폭 늘려 대학 재정의 약 90%를 감당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립대학 또는 지역거점국립대학을 무상교육화하자는 주장은 세계적인 교육 혁신의 흐름에 역행함이 분명하다. (책 248-249).

대학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우리는 ‘대학이란 무엇인가’를 묻게 된다. 대학이란 무엇인가? 대학은 학자를 위한 상아탑인가 아니면 대중을 위한 ‘서비스 공간’인가? ICT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미증유의 인구 절벽은 대학의 최후를 예고하는 듯하다.
『최후의 대학』은 지난 900년의 대학 역사를 훑던 저자가 대학을 움직였던 힘들의 역동을 발견하여 기록한 책이다. 이 책은 당대 지배 권력과 이데올로기에 순응 또는 저항하거나 타협하며 다음 시대를 열기도 했던 대학 변모의 여정을 다루고 있다. 지식인들의 학문·교육 공동체로 시작했던 중세 대학, 새로 등장한 여러 다른 교육기관과 대립하면서까지 전통 고수를 고집했던 근세 대학, 국가 교육 체제의 등장으로 국가별 상황에 맞게 적응했던 근대 대학, 경쟁 교육과 평등 교육을 넘나들면서 가능한 한 몸집을 키워가는 기업형 현대 대학 등 여러 유형의 대학의 태동, 성장, 쇠락의 과정을 다룬다. 이를 통해 대학이 다중적 힘의 역동 또는 길항 관계 속에 존재해 왔음을 드러낸다.
이 책은 중세, 근세, 근대, 현대의 대학 이념을 검토하면서 대학의 이념에 대해 도발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좋은 대학은 한 종류만이 존재하는가? 대학의 이념은 시대마다 달라지지 않았는가? 이념이 시대마다 달라질 수 있다면 동시대에도 복수로 존재할 수 있지 않은가? 저자는 좋은 대학, 즉 대학의 이데아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일 수 있다고 본다. 그러면서 저자는 탈플라톤적 비행을 감행하여 대학의 이념과 이데아가 복수적으로 존재하는 세계에 입국하자고 제안한다.
이 책은 QS 등 세계 대학 평가, ‘글로컬대학30’을 포함한 대학 구조조정,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우리나라 대학 관련 문제에 관한 저자의 생각 또한 분명하게 제시한다. 저자는 대학의 이념은 현실의 반영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대학의 이념을 제대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대학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다. 가령 세계 유수 대학, 즉 연구 중심 종합대학의 현실을 다음과 같이 적나라하게 기술한다. “연구 중심 대학의 위상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연구 중심 대학은 실험실, 실험 재료, 관련 장비, 연구 인력 등을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재정을 필요로 한다. 이런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정·군·산·학·연 복합체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한다. 그리고 대학이 이런 복합체에 참여하려면 정부나 산업체가 요구하는 성과를 단기간에 산출해 낼 수 있는 경쟁력과 수월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런 대학을 이념적으로 바람직한 대학으로 볼 수 있을까? 전 세계적으로 많은 학생과 교수가 연구 중심 종합대학에 소속되기를 원하면서도 연구 중심 종합대학이 자본의 토대 위에서 작동한다는 사실에 불편해한다. 여기서 우리는 ‘학자공화국’에 속한 사람들의 이념과 현실의 괴리를 발견한다.
이 책은 대학에 관한 학적 탐구와 현실 경험을 갖춘 사람의 저작이다. 저자는 대학교육을 연구하는 교육학자이자 대학 행정을 경험한 사람이며, 대학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했던 공직 경험자이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순수 학자’와는 다른 관점에서 대학의 역사를 해석한다. 이 책이 대학의 지형과 경계선을 새롭게 탐색하는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김재춘 영남대·교육학

영남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UCLA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OECD 교육분야 운영위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분과위원장, 대통령비서실 교육비서관, 교육부 차관,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영남대학교 교학부총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세 가지 관점으로 본 교육과정 이야기>, <학교의 미래, 미래의 학교> 외 다수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