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브르 식물기 | 장 앙리 파브르 지음 | 조은영 옮김 | 휴머니스트 | 464쪽

20세기의 위대한 자연주의자 장 앙리 파브르는 자연과학 제일의 가치인 ‘관찰’의 대가답게 몇십 년 동안 지구 전체 동물 가운데 4분의 3이나 차지하는 곤충의 삶을 꾸준히 주시하며 이에 대한 글을 10권의 책으로 썼다. 그 유명한 《파브르 곤충기》다.
그는 『파브르 곤충기』로 널리 알려졌지만, 식물학 박사 학위를 받고 식물도 깊이 연구했다. 수억 년 동안 곤충과 함께 공진화해온 식물이 그의 관심사와 맞닿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다. 그의 박사 학위 논문은 〈도마뱀난초의 괴경에 관한 연구〉이다. 《파브르 곤충기》 제1권이 출간되기 3년 전인 1876년에 파브르는 이 책 《파브르 식물기》를 출간했다. 앞서 1867년 출간했던 《나무의 역사(Histoire de la Buche)》에 2부가 추가된 구성이었다.
《파브르 식물기》는 지상 생명의 아름다운 조화를 흥미진진한 서사로 보여주는 과학 고전이다. 파브르의 시선은 그전까지 배경과 도구로 취급되었던 식물을 마이크로코스모스의 당당한 주인공으로 격상한다.
식물을 다루는 책으로는 이례적이게도 《파브르 식물기》에는 곤충뿐만 아니라 산호와 해파리 등 다양한 동물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한다. 파브르는 식물과 동물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공유하는 생명의 이치에 주목했다. 그의 눈에 땅 위에는 생명의 조화를 담은 작은 우주, 마이크로코스모스가 펼쳐져 있었다. 이 책을 시작하는 1장 〈산호와 나무〉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식물은 동물의 자매다.”
과거나 지금이나 식물은 배경과 도구로 취급되어 동물만큼 생명체로서 관심을 받지는 못하는 형편이다. 그걸 잘 알아서일까? 파브르는 “식물”이라는 제목을 달고 나온 이 책을 뜬금없이 수생동물인 히드라로 시작한다. 그러더니 폴립과 산호로 넘어가 책의 첫 장에서 속없이 동물 이야기만 한다. 이 책이 식물기인가 동물기인가 의심이 드는 순간 첫 장이 끝나며 이렇게 선언한다. “식물은 산호의 폴립으로 이루어진 폴립 공동체와 같다.” “히드라와 산호의 태곳적 역사가 그대들을 이 책의 주제인 식물로 안내한다.” 이후로도 동물은 이 책에서 수시로 등장하며 식물과의 비교 대상이자 식물의 세계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된다. 식물의 구조나 행동을 동물, 더 나아가 인간에 빗대는 것은 내용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 사람들에게 멀고도 가까운 식물이란 존재를 소개하는 최고의 전략이다. - 〈옮긴이의 말〉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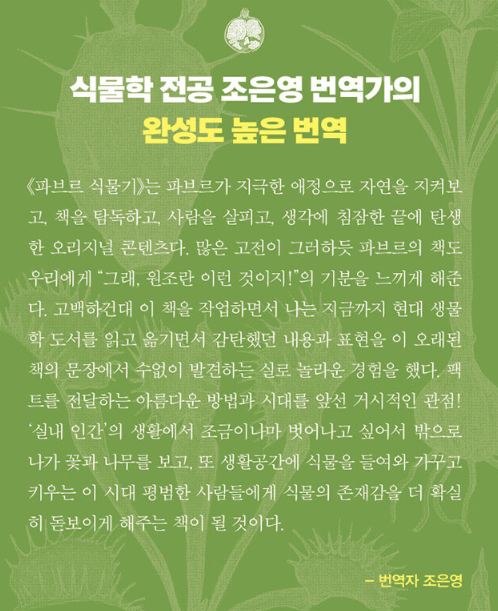
파브르는 이 책의 1부에서 식물의 현재를 조명하고 2부에서는 식물의 미래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식물계 전체의 범주와 각 범주의 상세한 특징, 식물을 구성하는 기본 구조인 뿌리·줄기·잎의 화학적 특성과 기본 요소 등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모든 특징들이 땅 위의 다른 생명체에게 미치는 영향을 짚어낸다. 서로서로 얽힌 생명체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그간 외울 것투성이로만 느껴졌던 식물에 대한 각종 과학적 사실이 단순한 자료의 나열이 아닌 자연의 맥락 속에서 길어 올려진 것임을 생생하게 이해하게 된다.
파브르의 책은 오늘날 자연과의 접점을 잃어가다 끝끝내 기후 위기를 맞이하게 된 현대인들에게 많은 질문을 남긴다. 빼어난 관찰자였던 파브르는 인간의 속도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곤충과 식물의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누구보다 그 관계성에 주목했던 과학자다. 식물 또한 동물과 마찬가지로 세상과 소통하며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자연이라는 거대한 맥락 속 식물과 곤충 나아가 인간까지 돌아보게 하는 그의 글은 다시금 자연주의적인 태도가 필요해진 지금 시대와 조용히, 그리고 오래 공명하고 있다.
파브르가 알려주는 식물 이야기는 단순한 과학적 지식의 나열과 다르다. 인위적인 구획에 따라 분류하거나 일방적으로 분절시켜 설명하지 않는다. 그의 글은 마치 식물의 삶 속에 들어가 함께 시간이라도 보낸 듯 생생하다.
다가올 미래를 책임질 자라나는 아이 격인 ‘눈’을 키워내면서 동시에 이제 제 할 일을 모두 마쳐 썩어버린 심재로 인해 속이 빈 나무의 모순적인 상황은 마치 세대 변화가 끝없이 이어지는 인간 사회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하다. 번식을 위해 풍작을 이룬 나무가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고 ‘해거리’라는 쉼을 위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은 마치 재충전을 위해 안식년을 가지는 우리네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 어린 식물의 뿌리를 빛을 향해 세워두었을 때 “차라리 죽고 말겠다는 기세”로 굴하지 않고 땅을 파고드는 모습 속에서는 고집쟁이의 면모를 바라보게 된다.
파브르가 들려주는 식물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우리는 자연과 인간의 연결을 새삼 깨닫게 되고 그 속에서 생명이 공유하는 이치를 깨닫게 된다. 모든 생명체의 “기원, 성질, 겉모습이 어떠하든 언제나” 같은 물질의 변형이라는 사실을 복잡하고 외울 것 많은 과학적 이론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생생한 삶의 원리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