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세 세트 Les Essais | 미셸 몽테뉴 지음 | 심민화·최권행 옮김 | 민음사 | 1,988쪽

1571년 법관직을 사직한 뒤 몽테뉴 성으로 은퇴한 16세기 프랑스 르네상스 최고의 사상가,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는 1592년 죽을 때까지 이십여 년간 107편의 짧고 긴 에세들을 집필했으며, 글쓰기를 시작한 지 칠 년째 되던 해에 그간에 쓴 글들을 묶어 ‘에세(Les Essais, 에세들)’라는 제목으로 초판을 출간하며 새로운 글쓰기 형식의 탄생을 알렸다. 에세(essai)는 ‘시험하다’, ‘경험하다’, ‘처음 해 보다’ 등을 뜻하는 동사 ‘에세이예(essayer)’에서 몽테뉴가 만들어 낸 명사로, 이 특별한 글쓰기 형식인 에세에서 영어로 통용되는 글쓰기 형식인 ‘에세이’가 탄생했다.
사건이 아니라 생각을 기술하는 몽테뉴의 에세들은 107가지의 다양한 제목 아래 인간사를 만드는 온갖 정념과 인간 세상의 오만 양상을 펜 끝에 소환하여, 마치 법정에서처럼 그의 정신과 마음, 영혼 안에서 서로 반박하거나 거들며 ‘나, 미셸’을 드러내고 증언하고 만들어 간다. 조상들이 정성을 쏟은 몽테뉴 성을 개축하고 고대인과 인문주의자들이 선망하던 ‘사색적 삶’을 살아보고자 은퇴한 몽테뉴는 ‘자기만의 방’에서 정신적 위기를 맞았고,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기 정신의 움직임을 글로 기록하기로 한다.

그의 글쓰기는 자기 정신을 관찰하고 제어하여, 자신의 본래 성정과 반대되는 우울에서 벗어나고, 그리하여 스스로 자기 정신의 고삐를 쥔 자가 되기 위한 ‘자기 탐구’의 방편이었다. 몽테뉴는 의문을 자극하거나 마음을 사로잡는 주제가 떠오르면 서적에서건 풍문에서건, 역사적 사실이나 일상 이야기에서건 그 에피소드와 관련한 예화들을 나열하고 대비하며, 서로 상충하고 모순되는 사례들이 만들어 내는 불확실성 속에서 자기 마음의 움직임을 살폈다.
그가 처음 자기 안에서 발견한 것은 그 혼란스런 정신 이외에는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렇게 시작된 자기 탐구의 과정을 통해 몽테뉴는 자기 안에서 인간 정신의 잡다함과 유동성을, 인간 감각과 이성의 허술함과 편파성을 발견하고, 그 한계를 보편적 인간 조건으로 인식한다. 그러고 나서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이 묻는다. ‘내가 무엇을 아는가?(Que sais je?)’
환멸과 폭력의 시대를 살면서 몽테뉴는 인간의 비참, 세상의 비참을 넘어 ‘세상 저편’, 또는 ‘무덤 저 너머’를 추구하지 않았다. 죽음은 삶의 매 순간을 강렬하게 만드는 배수진이 되고, “매 순간 내가 내게서 빠져나가는 것 같다.”라던 그의 인식은 글을 쓰면서 “시간의 신속함을 내 민첩함으로 나꿔채고 싶다.”라는 적극성으로 바뀐다. 몽테뉴는 자기 정신의 산물을 ‘망상’이나 ‘몽상’이라고 부르기를 그치지 않았지만, 그 겸손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내일 새롭게 주어질 대상 세계의 가능성, 새로운 ‘나’의 가능성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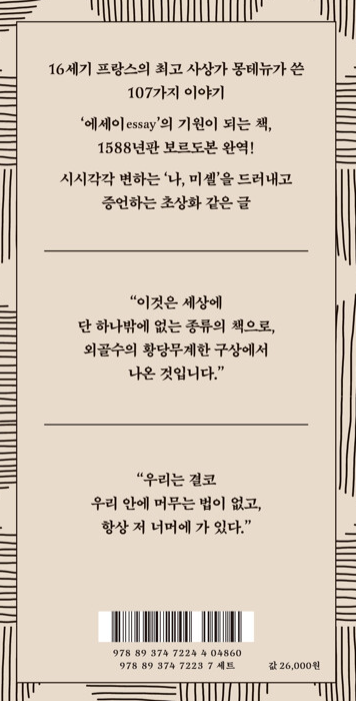
이처럼 인간에 대해서나 세상에 대해서나, 삶이 종지부를 찍을 미래에 대해서조차 환상 없이 오직 현실과 현상, 실재를 움켜쥐고,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잘 살고 잘 죽는 길을 찾기 위해, 죽기 직전까지 “세상에 잉크와 종이가 있는 한” 기록될 지금/여기(hic et nunc)의 시간, 부정에서 긍정으로 이행하는 시간, 『에세』를 읽으며 우리도 그 시간에 실려 간다. 『에세』를 읽다 보면 니체가 왜 그를 ‘승리자’라고 부르며, “승리자와 함께하면 행복하다.”(『반(反)시대적 고찰』)라고 했는지 이해하게 된다.
고대와 중세에도 자기 성찰은 자기 수련의 주요 항목이었으며, 그 성찰은 철학적, 종교적 유파들의 집단 강령에 따라 수행되었다. 중세인의 자기 인식은 종족, 가문 등 보편적이고 집단적인 형태에서만 이해 가능한 것이었다. 몽테뉴의 자아 탐구는 이러한 인식을 탈피한 ‘정신적 개인’인 ‘나’로 출발하며, 자기의 실재를 확인하고 스스로를 재정립하는 자기의, 자기에 의한, 자기를 위한 시도였다. 몽테뉴는 퓌론주의(회의주의)의 무견해 관습을 받아들여, 시시각각 자신에게 일어나는 현상 그대로를 관찰하여 글로 기록했다.
이러한 판단정지(에포케, Epoche)에 의한 현상학적 기술은 자기에 대한 자신의 주도권을 회복하고, 비판적 의식을 동반한 ‘주관적 견해’를 가지고 자기 삶의 주인으로, ‘주체’로 사는 길을 연다. 보편적 인간 조건을 말할 때 그는 ‘우리(nous)’를 주어로 말하고, 자신의 견해를 말할 때는 ‘나(je)’를 주어로 말한다. “이 에세들은 나의 변덕스러운 생각이요, 그것들을 통해 내가 하려는 것은 사물에 대한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 알게 하려는 것이다.” 종(種)으로서의 닮음은 우리를 동포가 되게 한다. 개개인의 다름은 우리를 대화하게 한다. ‘우리’이며 각각 개인인 독자는 지금, 몽테뉴와 동일한 보편적 인간 조건을 지닌 그와 동등한 ‘주체’로서, 그리고 우리와 마주한 한 근대인 몽테뉴를 만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