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의 나라 조선의 출판혁명 (상/하) | 황태연 지음 | 한국문화사 | 964쪽

저자 황태연 교수에 의하면, 이 책은 2-3개월 앞서 나온 『한국 금속활자의 실크로드』의 자매편으로 출판혁명은 바로 조선에서 일어난 반면, 서양에는 없었다는 사실史實을 입증하기 위해 집필된 것이다.
저자는 먼저 유교국가 조선이 국가이념상 필연적으로 ‘학교로서의 국가’이자 ‘출판사로서의 국가’임을 논증한다. 그리고 이 ‘학교국가·출판사국가’ 조선은 필연적으로 출판혁명을 요청했고, 그 대답이 금속활자 활판술과 이것에 기초한 ‘활인活印·번각飜刻 시스템’의 구축이었음을 입증한다.
목판인쇄술의 고유한 장점은 같은 책의 ‘대량생산’이고, 활판인쇄술의 고유한 장점은 여러 책들을 연달아 재再조판해서 부단히 찍어내는 ‘다多책종 생산’이다. 기존의 활자인쇄본 책을 본떠 목판을 ‘번각’하는 것은 개판開板 목판에 비해 많은 노동과 시간을 절약해준다. 목판 개판으로 책을 찍으려면 시간과 공비工費가 번각의 경우보다 수십 배 더 든다. 이 개판목판의 경우에는 글씨를 잘 쓰는 명필이 저자의 초서체 원고를 탈초脫抄하며 한지에 정서正書로 필사하고 각수가 이 정서된 한지 낱장을 차례로 받아 목판에 뒤집어 붙이고 뒤집어져 보이는 글자들을 그대로 새기는 식으로 작업해야 한다.
따라서 목판본 서적의 제작 시에는 제일먼저 정서할 명필을 구해야 하고 또 이 명필의 정서·필사작업에 상당히 많은 시간과 공비를 들여야 한다. 또 각수가 명필의 느린 정서 속도에 맞춰 각판해야 하므로 각수를 한 명밖에 쓸 수 없다. 그리하여 명필 1인이 하루 6페이지를 정서하고 각수가 정서하는 족족 각판한다고 하더라도 240페이지짜리 원고의 목판제작도 두 달 이상 걸린다. 그러나 한번 목판을 제작하면 100년 이상 쓸 수 있어 이 기간 동안 수많은 책을 찍어 내는 대량생산의 특장特長이 있다.
반면, ‘번각’은 이와 다른 공정을 밟는다. 일단 금속활자로 책을 100~200부 정도 활인活印하고(활자로 인쇄하고) 이 활인된 책을 전국 팔도의 감영에 내려 보낸 뒤 이 책을 찍은 금속활자 조판을 해판解版해서 바로 다른 책을 재再조판하는 식으로 계속 다양한 책종을 생산해내는 활자 고유의 특장特長, 즉 다책종 생산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한다. 완영完營(전주감영)·영영嶺營(대구감영)·기영箕營(평양감영) 등 팔도감영은 중앙에서 내려온 활인본活印本 서적을 바로 목판에 새겨 그대로 복제한다.
이 활인본 책을 해체해 얻은 낱장들을 수십 개의 목판에 뒤집어 물풀로 붙이고 수십 명의 각수刻手들을 투입해 각수만큼 많은 목판에다 거꾸로 비치는 낱장의 글씨를 그대로 새긴다. 노련한 각수 1인이 하루에 4개의 목판(4페이지)을 새긴다고 할 때 30명의 각수를 쓰면 240페이지짜리 책을 각판하는 공정은 단 이틀 만에 완료된다. 여러 사료에는 보통 30명에서 60명의 각수를 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번각목판도 개판목판처럼 100여 년 이상 쓸 수 있어 같은 책을 대량생산할 수 있다.
조선의 이 ‘활인·번각 시스템’은 금속활자의 특장(다책종 생산)과 목판술의 특장(대량생산)을 결합한다. 조선을 ‘책의 나라’, 중국인들이 부른 ‘문헌지방文獻之邦’으로 격상시킨 것은 바로 이 활인·번각 시스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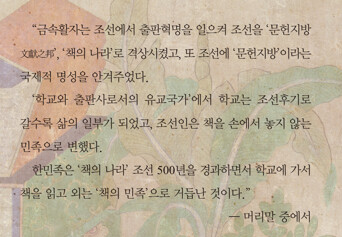
‘활인·번각 시스템’은 네 가지 이점을 가져다주었다. 첫째, 금속활자들을 원고의 글자대로 짜 맞춘 조판組版 틀로 100~200부 활인한 뒤, 재판·삼판·사판 인쇄나 그 이상의 인쇄는 번각으로 넘기고 기존의 조판들을 바로 해판解版해 재再확보된 활자들을 가지고 다른 책을 바로 재再조판할 수 있으므로 여러 종류의 책을 연달아 조판·활인하는 활판술 본연의 특장(다책종 생산)을 그대로 살리는 이점이다.
두 번째 이점은 사용한 활자들을 반복해서 재사용할 수 있으므로 주자鑄字의 양을 결정적으로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자漢字활자의 경우에도 10만여 개, 많아야 30만여 개 활자만 주자하면 어떤 거질巨帙의 한문서적이라도 다 찍어낼 수 있다. 또 세 번째 이점은 금속활자 활인본 책을 번각할 경우에 정서正書작업이 필요 없고 여러 명의 각수가 여러 개의 목판을 동시에 새김으로써 각판刻板시간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점이다. 넷째 이점은 번각목판의 대량생산 이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활인·번각 시스템에서는 최초 활인본의 일부를 대궐 장서고나 교서관, 규장각, 기타 중앙부처에 나눠 소장했다. 이 때문에 궐내 장서藏書는 거의 다 금속활자로 찍은 활인본이었다. 그래서 『누판고鏤板考』에서 서유구徐有榘는 궐내 장서의 “태반이 활판본이고, 대추나무에 새긴 것은 단지 열의 하나, 백의 하나일 따름”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궐내 장서는 90~99%가 활인본이었다는 말이다. 이것은 자금성 장서고(도서관)와 기타 부속전각에 소장된 서적의 99%가 목판본이었던 청대 중국의 대궐 장서와 정반대되는 양상이다.
조선 유교국가는 ‘출판사로서의 국가’였지만 결코 활자주조와 출판을 독점하지 않았다. 조선정부는 ‘문헌지방’이라는 명성에 대한 자부심을 ‘책이 많은 나라’와 ‘독서·출판·서적거래 자유의 나라’라는 의미로도 이해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대 조선정부는 금속활자의 사주私鑄와 목활자의 사제私製를 자유로이 방임했고, 또 때로는 이 사주 금속활자와 사제 목활자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사가나 사인은 사주·사제 활자를 정부에 빌려 주는 식으로 직접 지원하기도 하고, 개인 출판사들은 모자라는 학교교재를 공급함으로써 측면에서 지원하기도 했다.
조선정부에서 제작한 활자는 총 69종이고, 민간에서 만든 활자의 총수는 (정체가 분명한 활자만 계산해도) 42종에 달한다. 여기서 제외된 민간의 무수한 무명無名 활자들까지 합한다면, 정부와 민간이 제작한 활자 총수는 도합 총 300종을 상회할 것으로 추산되고, 300종 가운데 231종은 유·무명의 사인들이 주조·제작한 민간 활자였다.
조선 후기에 완성 단계에 이른 학교체제에서 공사립 서당(7만8318개소)+향교(333개소)+대학교 9개소(팔도의 지방대학 ‘영학營學’ 8개소와 중앙의 성균관 1개소) 등 학교의 총수는 도합 7만8660개소에 달했고, 학생 수는 78만 명(78만965명)이었다. 그리고 서원의 유생, 관청의 관료, 사찰의 승려 등으로 이루어진 지식층도 수백만 명으로 증가해 있었다. 결국 이래저래 조선은 매년 적어도 400~500만 부의 책을 공급해야 했다. ‘출판국가’의 조선정부, 사찰, 서원, 사가私家, 상업출판사(‘서사書肆’) 등은 출판혁명을 바탕으로 매년 이 천문학적 서적 수요를 충족시켰던 것이다.
사찰·암자, 서원·사우, 사가·개인이 활인·출판한 서적들에 대해서는 본론에서 상론한다. 민간부문에서 나온 활인본 서적의 총 책종은 이 책의 권말 [부록1] 「조선 500년 활인본 서적 총목록」 내의 ‘민간의 활인본 서책 생산’ 항목에 목록화되어 있다. 상업서점 서사書肆(출판사+책방)는 ‘가내서점’으로부터 ‘시중서점’으로 단계적으로 발전했는데, 비교적 분명한 상업적 정체성을 갖춘 최초의 가내서점은 1541년 『한서열전』을 목활자로 활인活印해서 판매한 ‘명례방’ 서점이다. 그리고 최초의 시중서점은 아마 18세기 초반부터 출판사 간판을 걸고 책을 인출해 진열·판매하기 시작한 완산(전주)의 ‘서계서포西溪書舖’일 것이다. 본론에서는 서사書肆에 대한 분석도 새로운 방식으로 시도된다.
금속활자는 조선에서 출판혁명을 일으켜 조선을 ‘문헌지방文獻之邦’, ‘책의 나라’로 격상시켰고, 또 조선에 ‘문헌지방’이라는 국제적 명성을 안겨주었다. ‘학교와 출판사로서의 유교국가’에서 학교는 조선후기로 갈수록 삶의 일부가 되었고, 조선인은 책을 손에서 놓지 않는 민족으로 변했다. 한민족은 ‘책의 나라’ 조선 500년을 경과하면서 학교에 가서 책을 읽고 외는 ‘책의 민족’으로 거듭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