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자에게 듣는다_ 『궁핍한 시대의 한국문학: 세계문학을 향한 열망』 (김욱동 지음, 연암서가, 384쪽, 202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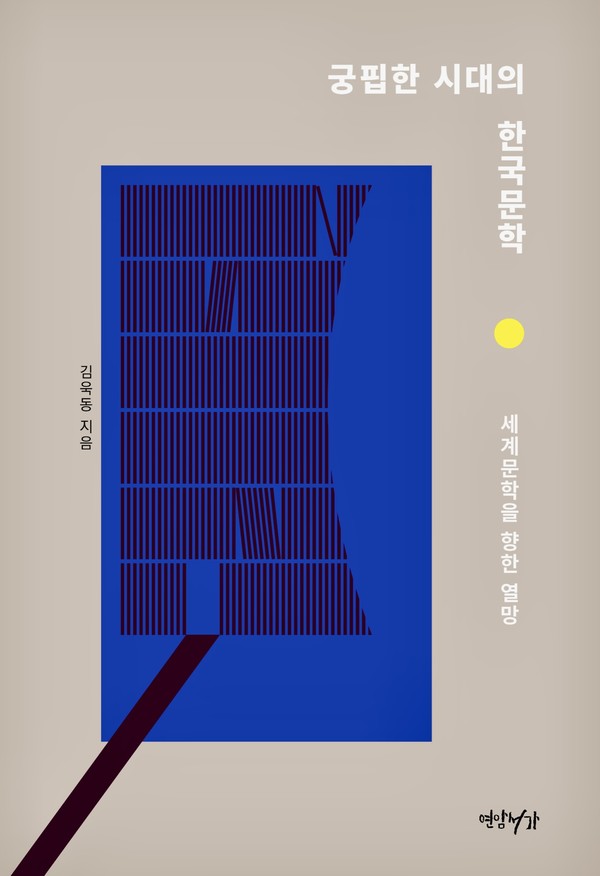
이 책을 쓰는 동안 나는 여러모로 ‘궁핍한 시대’를 살았던 우리 스승들과 선배들의 문학에 대한 정열이 참으로 대단했다는 생각을 좀처럼 뇌리에서 떨쳐버릴 수 없었다. 식민지 통치를 받던 암울한 시대 자국문학이 아직 성장하고 발전하는 단계에 있었으므로 더더욱 그럴 터이지만 그들이 외국문학에 보여준 관심과 열의는 참으로 대단하였다.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외국 서적과 잡지를 구해서 읽으려고 애썼고, 열악한 조건에서도 바다 건너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문학 활동에도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하였다. 일제강점기 문예지 《금성》에서는 ‘바이론 특집호’를, 《삼천리》에서는 ‘푸슈킨 탄생 100년 기념호’를, 《문예월간》에서는 ‘괴테 특집호’를, 《시원(詩苑)》에서는 ‘위고 특집호’를 낼 정도로 외국문학에 자못 큰 관심을 보였다. 한일병탄이 일어난 1910년 11월 레프 톨스토이가 타계했다는 소식이 식민지 조선에 전해지자 육당(六堂) 최남선(崔南善)은 《소년》 21호를 아예 톨스토이 서거를 추도하는 글로 잡지를 도배하다시피 하였다. 종합 월간잡지가 이렇게 한 호 지면을 통째로 한 외국 작가에게 할애한 경우는 외국에서도 좀처럼 볼 수 없는 특이한 현상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잡지만이 아니어서 당시 카페도 한몫을 톡톡히 하였다. 물론 일본 ‘다이쇼(大正) 데모크라시’의 문화적 유산이라고 할 카페가 식민지 조선에도 생겨나면서 여급을 둘러싼 향락 문화가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무렵 카페는 문인들이 모여 문학을 논하는 담론의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훨씬 더 컸다. 가령 이상(李箱)이 오늘날의 종로 1가에 문을 연 다방 ‘제비’는 프랑스 파리의 살롱처럼 문인들과 예술가들이 모여 고전음악을 감상하며 문학과 예술을 논하는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였다. 화가 이순석(李順石)이 지금의 소공동에 운영하던 카페 ‘낙랑파라’에서는 ‘투르게네프의 밤’을 열고, 오늘날의 충무로에 해당하는 혼마치(本町) 한 다과점에서는 ‘괴테의 밤’을 열었다. 이러한 모임에는 우익 문인들과 좌익 문인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문학적 이데올로기를 잠시 접어두고 함께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요즈음 같으면 중고등학교 문예반에서나 열 만한 그런 모임이었건만 그들은 조금도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해방을 분수령으로 그 이전의 문인들과 오늘날의 문인들을 비교해 보면 여러모로 큰 차이가 난다. 해방 이전의 문인들이 ‘거인’이라면 그 이후의 문인들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 있는 ‘난쟁이’와 같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 작가들의 활동은 겉으로는 무척 풍성해 보이는데 어딘지 모르게 속 빈 강정처럼 실속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해방 전의 문인과 그 후의 문인들은 아날로그 시대와 디지털 시대에 빗댈 수도 있을 것이다. 디지털 방식은 아날로그 방식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편리하고 정확하지만 후자는 전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그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
해방 이전의 문인들은 신문지 한 장이나 잡지 한 권을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다. 모든 물자가 부족하던 시대에 읽을거리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은 글을 무척 소중하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요즈음 젊은 세대들은 신문이나 잡지는커녕 좀처럼 책을 읽으려고 하지 않는다. 아침에 눈을 뜨기 무섭게 휴대전화나 태블릿 PC 같은 디지털 기기를 열어보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것이 디지털 세대의 일상이다. 그러고 보니 아날로그의 활자 매체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디지털의 이미지 왕국을 세운 지도 벌써 몇십 년이 지났다. 논리적 사고는 이미지보다는 활자 매체를 통하여 좀 더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나의 판단이다.
이 책은 졸저 『세계문학이란 무엇인가』(소명출판, 2020)의 제5장 ‘한국문학과 세계문학’의 내용을 단행본 분량으로 늘인 것이다. 이 주제는 무척 중요한데도 세계문학 전반을 조감하다 보니 조금 소홀히 다룰 수밖에 없었고, 책을 출간하고 난 뒤에도 늘 그 점이 목에 걸린 가시처럼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제5장을 따로 떼어내어 부족하거나 미진한 내용은 자세히 부연하였고, 애매하거나 모호한 부분은 좀 더 명료하게 다듬었으며, 사실에 어긋나거나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았다.
더구나 이 책은 『세계문학이란 무엇인가』뿐 아니라 더 나아가 『외국문학연구회와 《해외문학》』(2020, 소명출판), 『아메리카로 떠난 조선의 지식인들』(2020, 이숲), 『이양하』(2022, 삼인출판), 『비평의 변증법』(2022, 이숲), 『《우라키》와 한국 근대문학』(2022, 소명출판) 같은 저자의 또 다른 졸저의 연장선에서도 이루어졌다. 지금 펴내는 『한국문학과 세계문학』은 위에 언급한 졸저와 마찬가지로 일제 강점기에 외국문학을 전공한 조선인 젊은이들이 어떻게 한국 현대문학이 꽃을 피우는 데 비옥한 토양 역할을 했는지 밝히는 데 주력하였다. 이 무렵 외국문학을 전공한 학생들은 비단 외국문학 연구 그 자체에만 무게를 두지 않았다. 그들은 외국문학 연구를 발판으로 삼아 조선문학을 좀 더 발전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어떤 의미에서 당시 그들은 오늘날의 외국문학 전공자들보다도 훨씬 더 세계문학을 갈망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이 책의 제목을 ‘한국문학과 세계문학’이라고 거창하게 붙였지만 조금 과장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 책에서 다루는 ‘한국문학’은 일제 강점기와 해방 전후의 한국문학을 말한다. 나는 이 무렵 한국 작가들이 세계문학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세계문학의 광장에 나아가려고 어떠한 준비를 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여러모로 제약 받던 식민지 시대를 살면서도 문인들은 늘 세계문학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었다. 시인 월파(月波) 김상용(金尙鎔)은 “남으로 창을 내겠소. / 밭이 한참갈이 / 괭이로 파고 / 호미론 풀을 매지오”라고 노래하였다. 이 서정시는 세속적인 욕망을 모두 떨쳐버리고 자연과의 합일을 추구하려는 의지로도 읽을 수 있고, 전원에서 안분지족(安分知足)하려는 삶을 달관한 모습으로도 읽을 수 있으며, 일제 식민지 시대 어두운 터널을 무사히 빠져나가 광복의 밝은 미래를 맞이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염원으로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세계문학에 탐닉해 있는 나에게는 척박하다면 척박하다 할 문화적 토양에 굳건히 뿌리를 내린 한국 작가들이 세계문학의 창을 활짝 열어놓고 세계정신을 호흡하고 싶은 열망으로 읽힌다. “강냉이가 익걸랑 / 함께 와 자셔도 좋소”라는 구절은 한국문학이 세계문학의 대열에 합류하여 옥수수 알처럼 알알이 열매를 맺는 날, 지구촌 주민이 함께 모여 벌일 풍성한 문학의 향연으로 읽어도 좋을 것이다.
김욱동 서강대 명예교수·영문학

미국 뉴욕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서강대 인문대학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다. 환경문학, 번역학, 수사학, 문학비평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연구해 온 인문학자다. 주요 저서로는 《비평의 변증법: 김환태·김동석·김기림의 문학비평》(2022), 《이양하: 그의 삶과 문학》(2022), 《환경인문학과 인류의 미래》(2021), 《세계문학이란 무엇인가》(2020), 《외국문학연구회와〈해외문학〉》(2020), 《아메리카로 떠난 조선의 지식인들》(2020), 《눈솔 정인섭 평전》(2020), 《하퍼 리의 삶과 문학》(2020), 《미국의 단편소설 작가들》(2020) 외 다수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