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민지의 식탁 | 박현수 저 | 이숲 | 32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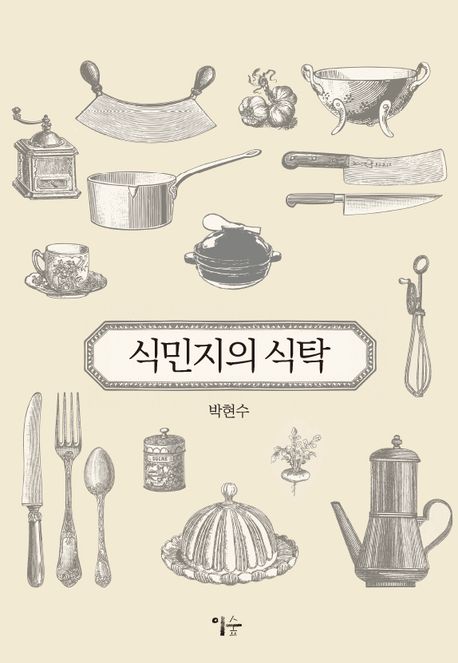
그 어느 때보다도 음식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그저 맛집 찾기에 몰두하거나 누가 더 많이 먹는지 겨루는 데에 그치는 1차원적인 현상에서 더 나아가, 저자는 먹는다는 행위의 온전한 의미를 물으려 한다. 이 책은 음식에 관한 폭발적 관심과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연구 사이의 어느 지점에 있다. 그 한편에는 독자들의 음식에 대한 궁금증이나 호기심을 해소시켜 보려는 생각이 놓여 있고 또 다른 한편에는 ‘맛있으면 무엇이든 먹어도 되고, 많이 먹어도 되는 것인가?’라는 문제의식도 자리하고 있다.
먹는다는 행위는 단지 배고픔을 덜고 맛을 즐기는 것에 머물지 않는다. 재료를 골라 음식을 조리해서 먹거나 음식점을 찾아가서 먹는 행위는, 먼저 개인의 경험이나 기호와 관련되어 있다. 나아가 사회적·문화적 취향과도 연결되며, 제도적인 기반에 지배되기도 한다. 지금처럼 사고하고 행동하는 방식이 현대의 출발과 맞물려 있다면 지금과 같이 먹게 된 것도 마찬가지이다. 안타까운 것은 한국에서 그 시기가 식민지라는 역사와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이 책이 식민지의 식탁에 주목하는 이유 역시 거기에 있다.
식민지시대 미츠코시백화점 식당에서는 어떤 음식을 팔았고 가격은 얼마였을까? 조선호텔 코스요리의 메뉴는 어떻게 구성되었고 맛은 어땠을까? 선술집에서는 지금으로 따지면 1,500원 정도 되는 값에 어떻게 막걸리 한 사발에 구이 한 종류를 팔 수 있었을까?
이 책의 저자가 제기하는 질문은 이러한 것들이다. 시시콜콜하게 느껴지지도 하지만 그만큼 흥미롭기도 하다. 식민지시대 음식에 대한 책의 궁금증은 위의 질문에 한정되는 것만도 아니다. 저자는 샌드위치, 라이스카레, 런치, 소바 등 식민지시대에 처음 등장했던 음식에 주목하거나 낙랑파라, 경성역 티룸, 명치제과의 메뉴판을 넘겨보기도 한다. 한편으로 비웃, 지짐이, 장국밥, 송이와 같이 식민지라는 굴레와 맞물려 식탁의 한편으로 밀려나야 했던 음식들에도 눈길을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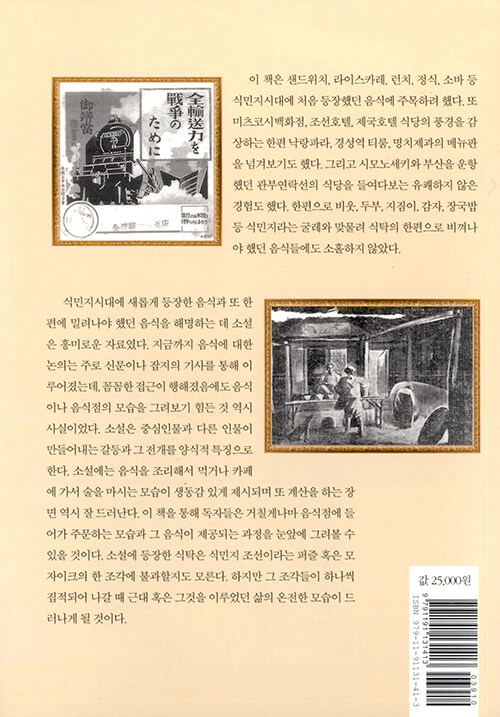
이 책은 어쩌면 너무 일상적이고 사소해서 해결하기 힘든 질문에 답하기 위해 식민지시대 소설의 도움을 빌리고 있다. 지금까지 1920~30년대 음식을 다룬 책들은 대부분은 신문이나 잡지의 기사를 주목했다. 여전히 식민지시대 음식이나 음식점의 모습을 떠올리기 힘든 것 역시 그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저자는 소설 속 음식에 주목한다. 참고한 소설들은 이광수의 『무정』, 염상섭의 『만세전』, 이상의 『날개』, 심훈의 『상록수』,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등 대표적인 한국소설이다. 우리는 이들 소설의 도움에 힘입어 거칠게나마 음식점의 풍경이나 메뉴, 또 계산하는 모습을 눈앞에 그려볼 수 있다.
책에는 구하기 힘든 옛 이미지 자료가 풍부하다. 소설이 연재될 때 실렸던 삽화, 아지노모도, 라이스카레 등의 신문 광고, 식민지시대 메뉴판 등의 이미지들은 1920, 30년대 음식과 음식점을 그려보는 데 도움을 준다. 식민지시대를 시각적으로 재현한 이미지 자료가 드물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 음식이나 음식점의 형태뿐 아니라 식문화 전반을 밝히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저자는 소설에 등장한 식탁에 주목하는 작업이 식민지 조선이라는 퍼즐 혹은 모자이크의 한 조각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그 조각들을 하나씩 집적해 나갈 때 근대 혹은 그것을 이루었던 삶의 온전한 모습 역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