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재, 인류와 만나다: 인간이 찾아내고 만들어온 모든 소재 이야기 | 홍완식 지음 | 삼성경제연구소 | 360쪽

이 책은 우연히 눈에 띄는 소재를 발견하여 쓰기 시작했던 아득히 먼 옛날부터 세상에 없던 소재를 직접 합성하여 쓰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상상력과 역사적 사실, 과학적 근거 등을 최적의 비율로 조합해 재구성해냈다. 인류 최초의 소재인 돌부터 도시 문명을 가능하게 한 청동, 로마 제국의 토대가 된 콘크리트와 유리, 산업혁명을 견인하며 소재의 맹주 자리에 오른 철강, 편리함과 환경오염이라는 양면성을 가진 플라스틱까지 소재의 시선으로 인류 역사를 되짚어 내려온다.
돌, 금속, 청동, 흙, 콘크리트와 유리(1장~5장)는 인류가 끼니를 해결하고 건축물을 짓고 도시를 창조하며 세상의 틀을 세우는 이야기를, 비료와 화학, 철강(6장~7장)은 소재가 인류를 굶주림에서 구해내는 한편 전쟁의 승패와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며 세계 질서 개편의 주체가 되는 이야기를, 섬유와 수지, 플라스틱(8장~9장)은 인류가 직접 소재를 합성하고 만들며 현대 문명을 쌓아올린 이야기를 품고 있다.
사냥을 하거나 열매를 따서 허기를 채웠던 최초의 인류에게는 단단하면서도 날카로운 모서리를 가진 도구가 절실했다. 사냥감을 공격하려면 충분히 단단해야 하고 수확물을 잘라 나누려면 날카로워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려면 잘 깨지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날카롭게 깨져야 한다는 모순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했다. 인류는 이러한 성질을 가진 흑요석과 수석(부싯돌)을 찾아내 구석기시대의 ‘맥가이버칼’인 좀돌날을 만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돌은 인류 최초의 소재라는 타이틀을 차지했다.
농업혁명이 일어나고 불을 사용하면서 도구의 개념도 바뀌었다. 농사를 지은 후 남는 수확물을 담아 저장할 용기가 필요했고 음식을 익히려면 뜨거운 불 위에서 견딜 수 있어야 했다. 금속을 발견하기 전이었기에 흙을 굽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높은 온도에서 구운 토기일수록 조직이 치밀해져 물이 새지도, 잘 깨지지도 않는 것을 알게 된 인류는 자연을 관찰하여 불의 온도를 높이는 방법을 하나하나 터득했고 석기 시대의 최첨단 기술인 가마를 만들었다. 불을 다루게 된 인류는 암석 깊이 숨은 금속을 뽑아낼 수 있게 되었고 금속은 청동, 철 등 인류 문명에 중요한 소재로 발전을 거듭했다.
인류의 역사를 소재로 구분할 때 현재를 철기시대라고 한다. 가장 중요한 소재로서 철의 위상을 잘 나타내는 말이다. 그러나 철이 처음부터 귀한 대접을 받았던 것은 아니다.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청동기를 대신하기 위해 개발된 초기의 철은 질감이 푸석푸석하고 녹도 잘 스는 등 품질이 떨어져 외면 받던 소재였다. 그러나 이리저리 두드리고 불에 달구다 보면 철은 놀랍게 단단해졌다. 비밀은 탄소에 있었다. 정확한 비율이나 그 원리는 잘 몰랐지만 사람들은 철에 탄소가 스며들면 청동보다 가볍고 단단해진다는 것을 알아냈다. 탄소의 적정량이 1%라는 것을 알아내기까지는 3,000년 가까운 오랜 시간이 필요했지만 인류는 철을 끈질기게 달구고 두드려 마침내 청동보다 강한 소재로 탈바꿈시켰다. 보잘것없던 소재가 인간의 끈기와 지혜에 힘입어 마침내 소재의 제왕으로 등극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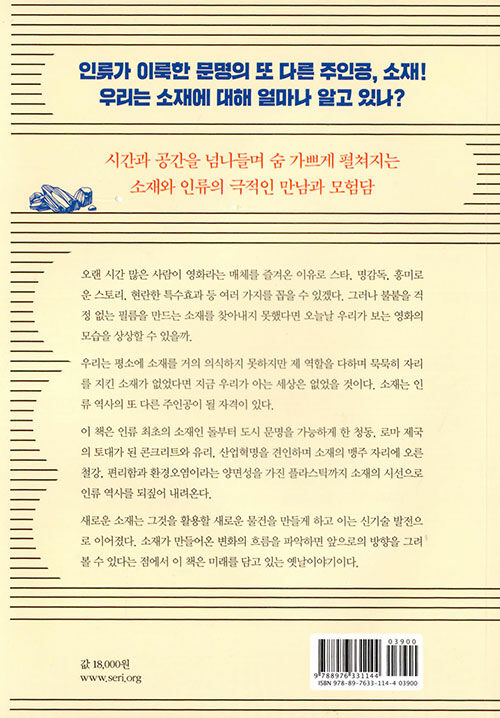
세월이 흘러 철이 단단해지는 과학적 원리가 규명되었고 이를 응용하여 대량생산이 가능해지자 기계, 철도, 교량 등의 재료로 쓰이며 철강의 수요가 폭발했고 산업혁명을 견인한 주인공이 되었다. 우수하고 값싼 철강 개발을 둘러싸고 베서머와 켈리 등 과학자들은 치열한 특허 전쟁을 벌였다. 철이야말로 인간과 소재가 만나 서로를 밀고 끌며 발전을 거듭하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다.
이쯤 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소재에 대해 ‘만약 그 소재가 없었다면?’이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 영화는 오랫동안 많은 사람이 극장에 모여 감상하며 즐겨온 대표적인 문화다. 그런데 하마터면 우리가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갈 때마다 방화복을 챙겨가야 했을지도 모를 사연이 숨어 있다. 초기에 필름으로 사용된 소재는 셀룰로이드인데, 이는 당구공을 만드는 데 쓰이던 상아의 대체제로 개발된 것이다. 그런데 셀룰로이드는 불이 잘 붙는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불이 잘 붙지 않는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로 만든 필름이 보급될 때 이 필름에는 ‘안전한 필름(safety film)’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우리가 좋은 영화를 떠올릴 때 흔히 스타, 명감독, 감동적인 스토리 같은 것을 그 이유로 꼽지만 무엇보다 화재 걱정 없는 필름 소재의 개발이야말로 영화 문화가 존재할 수 있었던 바탕이라는 것을 새삼 실감하게 되는 대목이다.
2020년 말, 과학 학술지 《네이처》는 흥미로운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인간이 만든 인공물의 총 질량이 2020년을 기점으로 자연에서 만들어진 생명체의 총 질량을 넘어서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인공물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자연에서 소재를 얻었던 인류가 현대에 와서는 소재 자체를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 플라스틱이 있다.
흔히 플라스틱을 20세기에 세상의 얼굴을 바꾼 기적의 신소재라고 한다. 혹자는 20세기를 철기 시대가 아닌 플라스틱 시대라고도 한다. 이전까지 자연에서 채취한 소재를 분리하고 정제하는 데 머무르던 인류는 물질의 기본 단위인 분자를 설계하고 합성하여 새로운 소재를 창출하는 단계로 들어섰다. 플라스틱은 희귀한 소재를 대체하여 많은 동식물의 멸종을 막고 인류에게는 편리함과 풍요로운 물질문명을 가져다주었지만 환경오염 등 생태계를 위협하는 문제를 일으키는 두 얼굴의 소재이기도 하다. 이는 물질문명이 낳는 부작용 제거라는 또 다른 숙제를 인류에게 던져준다.
이 숙제에 대해서 저자는 소재에 길을 묻고 답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한다. 아직 미지의 소재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자신들을 깨워 세상의 빛을 보게 해줄 것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물음표를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