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배자의 입맛을 정복하다: 여섯 가지 음식으로 본 음식의 역제국주의 | 남원상 지음 | 따비 | 32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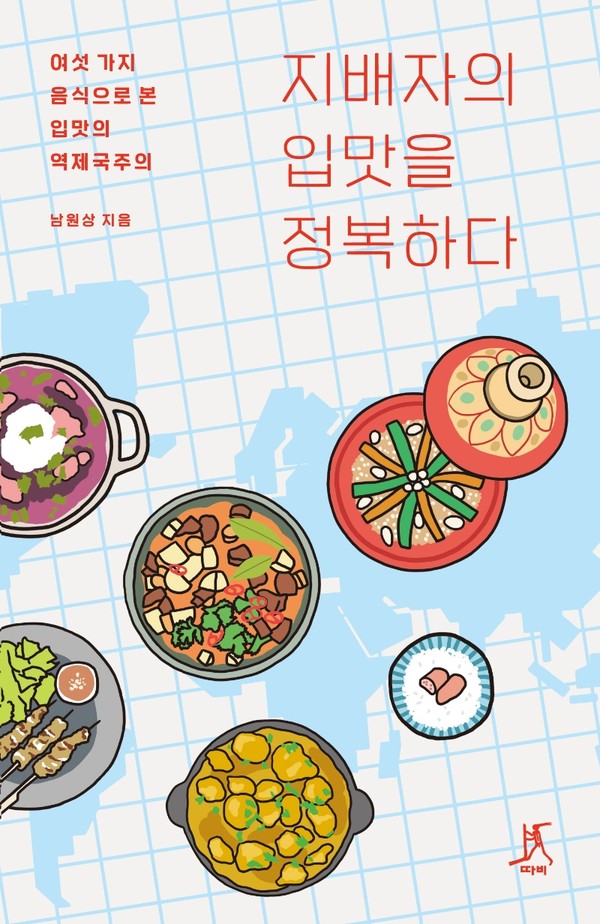
마케팅을 위해 스토리텔링을 입힌 음식이든, 고난과 역경을 극복한 상징이든, 어느 음식에 사연 하나 없겠는가. 하지만 이 책에서 소개하는 음식들의 사연은 그 스케일이 남다르다. 한 민족의 전통음식이었다가, 식민지의 비천한 음식으로 전락했다가, 지배자의 식탁에 일상적으로 오르는 음식이 된 여정 때문이다. 때로는 세련된 이국 취향이 반영된 미식으로, 때로는 원래부터 자국 음식이었다는 듯이.
저자는 피지배자의 전통음식이 지배자의 식탁으로 역으로 침투한 이 현상을 ‘음식의 역제국주의’로 명명했다. 어떤 음식은 바로 옆 나라로 스며들었고 어떤 음식은 대양과 대륙을 넘어 이동했는데, 그 시기와 맥락이 다른 만큼 각국에서 받고 있는 취급도 다르다. 그 여섯 가지 음식의 여섯 가지 이야기를 살펴보자.
첫 번째 음식은 결국 필리포를 사임하게 만든 쿠스쿠스다. 쿠스쿠스의 재료는 듀럼밀durum wheat을 빻은 밀가루인 세몰리나semolina인데, 이 세몰리나에 따뜻한 소금물을 넣고 반죽한 뒤 손으로 일일이 비벼가며 좁쌀 크기로 동글동글하게 빚은 다음 건조시켜 만든다. 이 음식은 북아프리카 마그레브 지역에서 프랑스로 옮겨 갔다. 일찍이 신대륙 정복에 뛰어들었지만 스페인, 영국에 밀린 프랑스가 그 대안으로 눈을 돌린 지역 중 하나가 북아프리카였다. 북아프리카로 이주했다 돌아온 자국민이 이어온 입맛으로 인해, 또 혼란한 정치상황을 피해 또 일자리를 찾기 위해 밀려든 북아프리카 이주민(난민도 포함해서)에 의해, 프랑스는 유럽 전체 쿠스쿠스 소비량의 43%를 먹어치우고 있다.

두 번째 음식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로 옮겨 간 보르시다. 쇠고기(닭고기 등 다른 육류를 쓰기도 한다) 육수에 비트, 양파, 감자, 당근, 마늘 등 각종 채소를 넣어 끓인 수프로, 특유의 시큼하고 달달한 맛과 붉은색으로 인해 미각적으로나 시각적으로나 강렬한 느낌을 주는 음식이다. 한때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묶였던 두 국가이지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합병된 것은 러시아 혁명 이후가 아니다. 키예프 루시라는 같은 뿌리를 가졌지만 15세기 이후 갈라졌다. 1783년 예카테리나 2세가 지배한 러시아 제국에 병합되었다 독립하는가 싶더니, 1921년 소련으로 편입됐다. 이런 역사 탓에, 베두인이라는 뿌리를 확실히 인정받는 쿠스쿠스와 달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자존심을 건 보르시 종주국 논쟁을 벌이고 있다.

세 번째 음식이 바로 커리. 해가 지지 않는 식민지를 건설했던 대영제국으로 유입된 수많은 음식 중에서 빅토리아 여왕이 전속 요리사를 둘 정도로 영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인더스 문명으로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이 음식에 영국의 기여가 없지는 않으니, 커리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다. 제각각의 가정에서, 제각각의 향신료를 써서, 제각각의 방식으로 즐기던 음식에 커리라는 이름을 붙이고, 몇몇 향신료를 배합해 커리 파우더로 상품화한 것이 식민지 음식에 빠진 영국이다. 우리가 일본을 통해 들여와 즐기는 ‘카레’는, 실은 인도가 아니라 영국산産이었던 것이다. 이제 커리는 영국뿐 아니라 전 세계인이 제각각의 방식으로 즐기는 음식이 되었지만, 인도의 인장은 강렬하게 남아 있다. 그 재료가 되는 향신료가 인도에서만 나기 때문이다.

네 번째 음식은 동유럽을 여행하는 한국인에게 마치 김치찌개 같은 친근감을 선사하는 음식, 굴라시다. 체코에서도, 오스트리아에서도 만날 수 있는 이 음식은 원래 헝가리 음식이다. 유목민의 후예 헝가리 목동들이 개울에서 퍼 온 물을 솥에 가득 붓고 바짝 말린 육포와 각종 허브(마치 라면의 건더기 수프처럼)를 넣어 푹 끓인 국물 요리였다. 목동이나 먹던 비천한 음식이었던 굴라시는 합스부르크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헝가리 문화와 저항의 상징으로 거듭났다. 종주국 헝가리의 굴라시, 헝가리를 복속시켰던 오스트리아의 굴라시, 합스부르크 제국에 같이 복속된 처지였던 체코의 굴라시는 제각각 발달하며 굴라시의 외연을 넓히고 있다.

다섯 번째 음식은 사테. 꼬치구이를 어떻게 한 민족 혹은 국가 고유의 음식이라고 할 수 있나 싶겠지만, 사람이 거주하는 섬만 약 6,000개에 이르는 인도네시아라면 얘기가 다르다. 각 섬에서 저마다의 문화를 발전시켜온 인도네시아의 거의 모든 사람이 즐긴다면 국민 음식이라 할 만하지 않을까. 이 사테가 넘어간 곳은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처음에는 향신료 무역의 근거지로, 향신료의 가치가 떨어진 다음에는 플랜테이션 농장 경영을 위해 인도네시아를 지배했다. 인도네시아 독립과 함께 네덜란드계 백인, 유라시아 혼혈 인도더치가 대거 이주하면서 인도네시아의 식문화도 네덜란드로 건너갔다. 그중 사테는 최고로 인기를 끌었는데, 땅콩버터가 들어간 사테 소스는 네덜란드에서 만능 소스로 활용되고 있다.

마지막 음식은 바로 한국 음식 명란젓. 명태는 동해안에서 지천으로 잡혔던 생선이다. 제사에, 고사에 빠지지 않는 북어를 이고 진 상인들이 전국 곳곳으로 다녔고, 명태를 말리기 위해 빼내야 하는 알집과 내장이 명란젓으로 창난젓으로 변신했다. 그런데 규슈 후쿠오카현의 특산으로 일본 전역에 알려진 멘타이코明太子가 바로 명란젓이다. 부산에서 태어난 일본인 가와하라가 태평양전쟁 패전으로 귀국한 후, 그 맛을 잊지 못해 직접 담가 먹다 판매까지 하게 된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황당하게도 일본 내에서 원조 논쟁을 벌일 정도로 이 일본식 명란젓은 인기를 끌고 있다. 이제 한국에서도 명란젓을 멘타이코식으로 제조하는 것이 더 씁쓸한 일인지, 더 이상 동해바다에서 명태를 잡을 수 없는 것이 더 씁쓸한 일인지.

서로 다른 자초지종을 지닌 이 음식들의 한 가지 공통점을 꼽자면, 피지배 국가나 민족의 하층민이 즐겨 먹던 싸구려 먹거리에서 출발했다는 것이다. 전복은 국가 간의 지배-피지배에만 국한되지 않고 음식 자체의 위상에도 영향을 미쳤다. 무엇보다 이 음식들은 맛있기 때문일 것이다. 맛있는 음식 이야기는 또한 맛있게 마련인데, 복잡한 세계사가 양념처럼 이야기의 맛을 돋운다.


